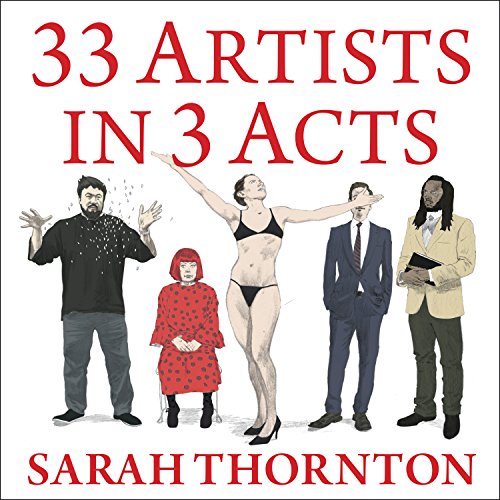- 제목: [예술가의 뒷모습: ‘벌거벗은’ 현대미술가와 현대미술의 ‘진짜’ 초상(33 Artists in 3 Acts)]
- 저자: 세라 손튼(Sarah Thornton), 번역: 배수희
- 출판사: 세미콜론
- 출간일: 2016년 2월 15일 (2019년 2쇄)
- 분량, 무게, 크기: 584쪽 | 766g | 143*220*28mm
- 도서 분류 (예스24 기준)
- 국내도서 > 예술 > 미술 > 미술일반/교양
- 국내도서 > 예술 > 미술 > 미술사/미술가론
잠시, 이번 책의 저자인 세라 손튼의 개인 웹사이트 첫 페이지에 있는 자기소개를 살펴봅니다.
Sarah Thornton is a sociologist who writes about art, design and people. She is the author of four critically acclaimed books. A Canadian who went to the UK on a Commonwealth Scholarship, Thornton was once hailed as “Britain’s hippest academic.” Now based in San Francisco, Thornton is better known as “the Jane Goodall of the art world.”
– https://www.sarah-thornton.com
손튼은 미술사 학사를 한 뒤, 박사 학위는 문화의 사회학Sociology of Culture으로 획득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쓴 책은 2024년 5월 7일 발간된 [Tits Up: What Sex Workers, Milk Bankers, Plastic Surgeons, Bra Designers, and Witches Tell Us about Breasts](2024). ‘여성의 유방에 대한 문화사회학’이라 할 만한 책입니다.
손튼은 지금까지 네 권의 책을 썼습니다.
- [Club Cultures: Music, Media, and Subcultural Capital](1996)
- [Seven Days in the Art World](2008)
- [33 Artists in 3 Acts](2014)
특히나 [Seven Days…]는 국내에 또 다른 ‘뒷모습’ 책으로 번역된 바 있습니다.
오늘의 책을 낸 것과 같은 출판사인 세미콜론에서 나왔고, 번역자도 같습니다. (다만 [걸작의…]의 경우 큐레이터이기도 한 이대형 님과 공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 책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발간된 책이라는 점입니다. 책을 읽을 때 반드시 감안해야 하는 점이죠. (2014년 시점임을 생각하며, 서문 정도만 다시 한 번 읽어보아도 좋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책 8~9페이지에 있는 지도를 다시 살펴봐도 좋겠습니다.
만약 2024년에 이 책과 같은 기획으로 또 다른 책이 발간된다면, 이 지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최근 몇 년 사이 베니스 비엔날레와 같은 주요 전시의 참여 작가 목록을 감안해보면, (2014년에 발간되어 2016년 번역 출간된) 이 책의 지도에서 호명되지 않은 지역과 국가를 많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 한국 출신의 작가도 1~2명은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누가 실리게 될까요? 양혜규나 이불 작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점은, [예술가의 뒷모습](2014년 출간, 2016년 한국어판 출간) 그리고 [걸작의 뒷모습](2008년 출간, 2011년 한국어판 출간) 두 권 모두 예술/미술계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에 살짝 앞서 출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모임을 위해 함께 읽은 [예술가의…]는 #미투 운동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난 2016년에 앞서 나왔고, [걸작의…]는 전 지구적 금융 위기가 벌어진 2008년에 앞서 완성되어 발간되었습니다.
참고로, [걸작의…]는 예술/미술계의 주요 행사와 장소를 기점으로 저자가 일종의 문화인류학적 관찰을 선보이는 책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예술가의…] 역시 그저 작가/예술가/미술가들의 작업 세계를 소개하기보다 그들을 일종의 관찰 대상으로 삼는 것 같습니다. 영문으로 된 책 소개에 따르면, 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This compelling narrative goes behind the scenes with the world’s most important living artists to humanize and demystify contemporary art.”
자, 과연 책이 목표한 바 대로 중요한 작가/미술가/예술가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마주하고 동시대 미술/예술에 대한 신화에서 한 걸음 벗어나게 되었나요? 이번 책을 2018년 5월에도 [미술아냥] 모임에서 한 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 참가한 분들이 남긴 독서 노트들의 제목을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 미술의 역할은 무엇인가
- 예술가의 뒷모습
- ‘미술가’에게 첫걸음
- 우아함과 추함 사이
- “예술”을 정의한다면
- 뒷모습
- 우리도 예술가일 수 있을까요?
- 양파같은 현대미술의 뒷모습
- 예술가의 뒷모습 – 재수를 해도 여전히 오리무중 *여러 시즌 모임에 참가하신 분이 남긴 노트
- 아우라를 벗은 예술가, 그리고 색안경을 벗은 나
- 도대체 어디까지가 미술인데?
- 철학을 담은 예술가의 새로운 시선을 탐하다
- 그래서 미술가란 무엇일까?
- 이 시대의 미술가란…?
그럼, 이번 모임의 노트들도 제목을 한 번 봅시다.
- 두 번째 독후감
- 현대미술이라는 밀림, 세라 손튼은 제인 구달이 되고 싶었나?
- 영화감독 vs. 장인으로서의 예술가
- 예술가의 옆모습
- 화려하지만 공허한 옥션에서 다루어지는 작품의 가치란 무엇인가
- 예술가의 작품활동의 배경을 알게 되는 책
- 가치 판단을 포기한 사람의 독후감
- 예술가의 정치적인 모습
- 인터뷰
- 대중성과 상업성을 추구하는 것은 과연 악일까?
(여기서 자연스럽게 덧붙여 보는 고은의 노트)
“나는 미술을 믿지 않는다. 미술가를 믿는다.”
세라 손튼의 이 책은 위 마르셀 뒤샹의 말에 물음표를 던지며 시작된다. 그럼 나는 ‘미술’을 믿는가? ‘미술가’를 믿는가? 미술을 근본적인 가치나 행위가 아닌 일종의 네트워크, 생태로 본다면 뒤샹의 말처럼 ‘미술’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매일, 매 순간 다른 높이와 모양으로 치는 파도처럼 도무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라리 뒤샹의 말처럼 그 실체(이 역시 정의내리기 어려우나),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주체를 믿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다시 ‘미술가’조차 믿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미술계가 파도 같은 것이라면, ‘프로 미술가’는 그 위를 유려하게 타는 서퍼같은 존재로 비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도에 따라 그들은 수면 위와 아래를 오간다. 거기에는 분명 ‘낭만적이지 않은 현실’이 있다. 저자는 그 현실을 감내하고 있는 선수들을 찾아 인터뷰했다. 그러나 “미술가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은 그들을 꽤 당혹스럽게 한 것 같다. 존재의 이유를 묻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저자의 질문이 이 세계의 실체를 얼마나 제대로 보게했는지는 모르겠다. 손튼이 밝힌 것 처럼, 달변가로 익히 알려진 몇 몇 작가들 조차 서툴거나 방어적인 대답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미술계의 현실은 무엇인가요?” “미술가로서 당신의 고민은 뭔가요?“, “다음 전시계획은 언제죠?” 따위 질문은 그들을 신나게 답했을 것이다.
이 책은 미술계의 여러 모순적인 태도를 전면에 드러내기 보다는 의도적인 중립성 지키며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시켰다는 인상을 준다. 물론, 저자가 캐롤 더넘에게 ‘진실함’에 대해 물고 늘어지는 지점이나, 아이웨이웨이의 눈썹을 치켜 띄게하는 표정을 이끌어 낸 부분은 꽤 흥미진진했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속시원한 하나의 해설을 만들어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거기엔 누군가를 피해자, 악당, 또는 영웅으로 그려내야하지만 현실은 모두 혼재 되어있기 때문이다. 시원함은 없지만 이 또한 현실의 한 측면으로 이해하게되는, 나의 입장과도 닮은 것 같아 보였다. 이래서는 무엇도 믿는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상태가 된다. 미술도 미술가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또 너무 서툴고 방어적인 답변일까?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질문(들)
- 예술가/미술가/작가/아티스트 혹은 예술계 종사자들에 대한 고정관념, 환상, 이미지가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공유해봅시다.
- 여러분이 경험한 미술계의 모순들 중 가장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 책에 등장한 예술가/미술가/작가/아티스트 가운데 가장 흥미롭거나, 이해가 안가거나, 더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혹은 이 책에 한 인물로 등장하길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 예술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술가의 일은 무엇으로 이뤄져 있다고 보시나요?
독서 노트 인용
노트를 올려주신 순서에 따라, 이름을 익명화 하여 공유합니다.
미술가란 무엇인지 인터뷰의 형식으로 진행하는 저자의 접근법이 생소하기도 했거니와 그 질문에 미술가가 아닌 나를 투영해서 ‘OOOO이란 무엇인가’로 생각이 귀결되다보니 집중이 어려웠다.
…
미술가란 무엇인지 마사 로슬러의 기준에 저자의 ‘정치’라는 단어를 잇대어 보면 “내적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미술가의 진지함”의 정도에 따라 작품에 내재된 정치의 함량이 다른 것 같다.
극단적으로 정치를 무첨가한 작품을 제작하면 ‘순진한 미술가’인 듯 한데, 제프쿤스는 본인은 순진한 미술가가 아니라고 발끈하며 단지 사회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 부분이 기억에 남는다.
– OOO
이렇게 구구절절한 설명은 마치 해명과도 같아서 작가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많은 미술가들은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한다. 그건 아마도 미술가들이 자신들에게 드리워진 신화의 베일을 걷어내고 싶어 하지 않는 의도적 회피이거나 본능적 방어 둘 중 하나일 것이다. 페르소나에 대한 반복적이고 어떻게 보면 강박적인 인터뷰 질문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여겨졌다. 계속 물어보는 지은이와 에둘러 피하는 미술가들의 팽팽한 대결은 마치 야생동물을 관찰하고자 하는 생태학자의 집요한 노력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런 지점들이 세라 손튼을 제인 구달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
숙련작업
이 부분에서 제일 혼동스러웠다.
– ㄱOO
“숙련 작업”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봅시다!
디렉팅을 하는 영화감독 같은 예술가부터 장인 정신으로 직접 노동을 고집하는 예술가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인물들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된 것 같다. …제프 쿤스는 반복적으로 다른 예술가들의 인터뷰에서도 언급되는데,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상업성이 짙은 그의 작품에 대한 혹평이 많다는 점이 흥미로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제프 쿤스의 예술을 상업용 블록버스터 영화에 비유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 OㅅO
“예술가의 옆모습”
… 그 이전엔 무엇을 기준으로 현대미술은 거래되었던 것일까?
… “미학적 가치와 상업적 가치가 완전히 상호작용하는 건 아니”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반응은 없지만 훌륭한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많다”고 하는 그의 말에서 “훌륭한” 작업의 기준이란 무엇인가?
… 10년 안에 가치가 등락할 수 있다는 것은 단지 미술시장이 유행에 쉽게 흔들린다는 뜻인데, 누가 이런 유행을 조장하는 것일까? 수요자가 적은 미술시장이 유행이 패션처럼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라 보긴 어려운 것 같은데 말이다.
– OㅅO이러한 미술의 배경으로부터 나온 작품을 나는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 ㅂOO“가치 판단을 포기한 사람의 독후감”
쿤스나 허스트의 말을 보고 있으면 ‘돈이 나쁠게 뭔가’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웨이웨이나 프레이저의 말을 보고 있자니 끊임없는 주제 의식 표명과 자아성찰이 역시나 미술의 묘미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중간중간 저자가 계속해 던지는 ‘미술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나로 하여금 ‘미술과 미술가’ 중 선행하는 것은 무언인지, 이들은 미술가가 되기에 너무 바쁜 게 아닌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 OOㅅ미술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미술가가 미술 작품의 일부라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 실제로 몇년 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아이웨이웨이에 대해 잘 모른 채로 그의 전시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막연히 일반적이라고 생각했던 미술가&미술작품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약간 당황했던 게 기억난다. 개인적으로 미술 전시라기보다는 어떤 행동주의자의 고발 프로그램을 보고 온 느낌이었다.
– OOㅇ그렇게 즐겁게 읽진 않았고. 사실 관심도 안들었다. 잘은 모르겠지만, 세계적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편린을 목도했다.
– ㄱOO이런 ‘노 관심’의 배경이 궁금합니다..!
“대중성과 상업성을 추구하는 것은 과연 악일까?”
결국 미술가들이 작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스스로 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중성과 상업성을 추구하는 게 과연 악일까라는 의문이 계속 생겼다.
– ㄱ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