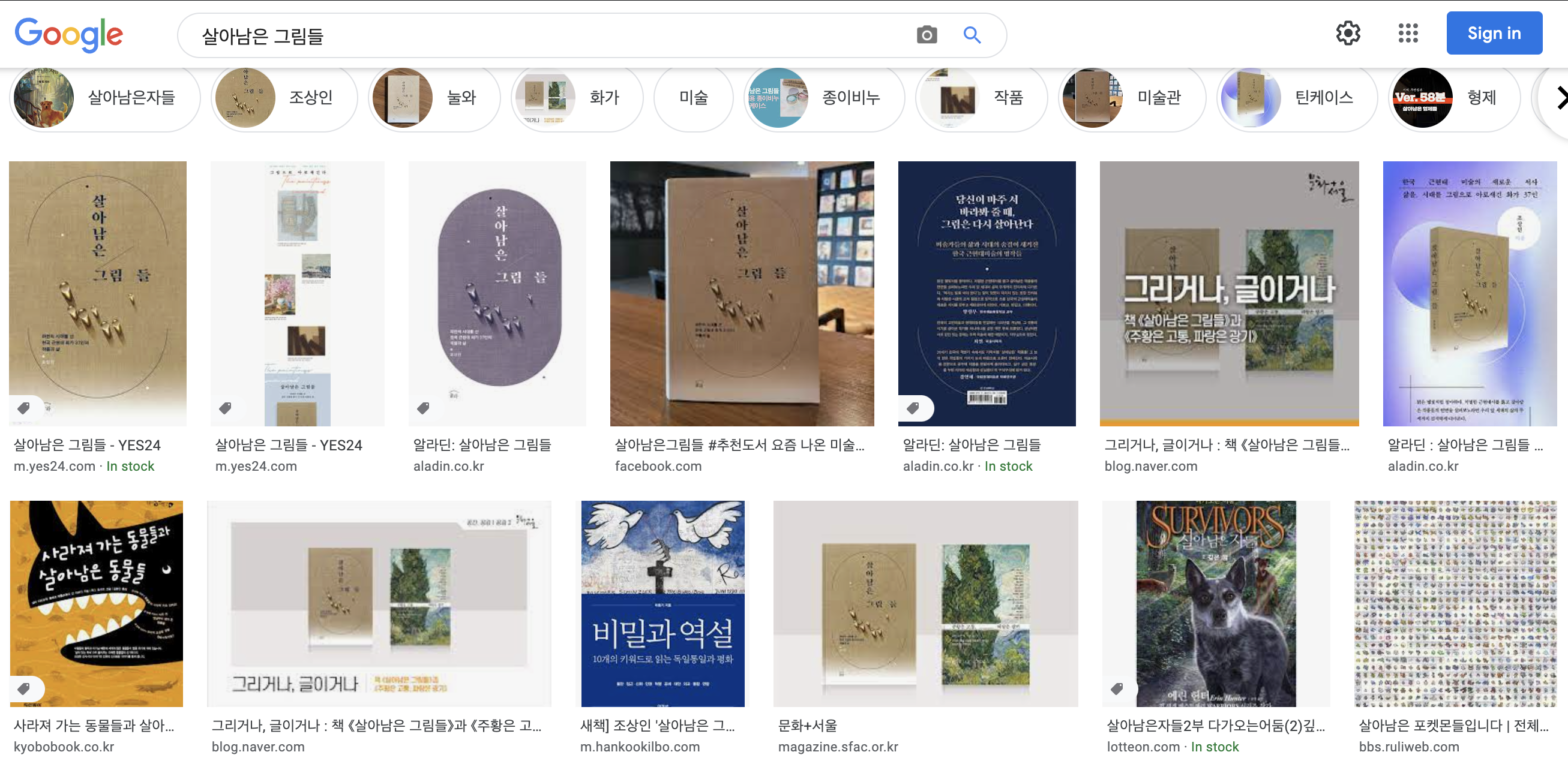여는 말: 제주로부터
약 일 주일 전의 결혼식 이후, 예상치 못한 반응과 관심에 놀라며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 중 하나는,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사는 개인은 시간 속을 살아가는 하나의 객체일 뿐이며 개인의 행위와 선택이 점점이 모여 하나의 흐름, 역사가 된다는 점입니다.
간만에 가볍게 읽어볼 수 있었던 책, [살아남은 그림들]이 다루고 있는 건 그러한 개인들 가운데 (이번 시즌 멤버인 ㄱOO 님의 말을 빌자면) “자신의 흔적들을 그림으로 붙잡아 ‘살아 있음’을 영원히 새기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미술 작품을 세상에 남기고 간 미술가 37명에 관한 이야기를 모은 책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일 혹은 업적을 이 책에서 처럼 몇 장의 원고로 남긴다면 과연 어떤 이야기를 쓰게 될까요? 책에서 처럼, “ㄱOO가 ~~를 처음 접했던 시기는 한국 사회가 XX로 큰 변화를 겪고 있던 역동의 시기였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XX에 영향을 받았을 거라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터. 당시 그가 매월 출석하던 책 읽기 모임 ‘트레바리’ 게시판에 남겨둔 글에서도 이를 유추할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쓰이게 될까요?
– 박재용
송고은의 노트
역사학자는 결코 아니지만, 전시 큐레이팅에서 역사를 어떻게 얼마나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일 입니다. 여기서 그 대문자 History역사는 서양의 시선으로 바라 본 역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사실 저는 있는 한국 근대미술의 이야기에 대해 1세계의 역사가들의 시선을 따르는 일에 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몇 해 전 제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서촌 한켠 (약 100년의 시차를 두었지만) 바로 옆 담장에 살았던 독특한 인물들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되며 비로소 한국의 ‘근대’ 그리고 그 시절의 미술에 대한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종종 경성 시대의 서울과 거기서 살았던 예술가들을 상상해보곤 합니다. [살아남은 그림들](조상인, 2020) 역시 그 시절로 부터 시작됩니다.
나혜석은 1913년에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에 입학합니다. 한국 여성으로는 최초로 ‘서양화 전공’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보통 나혜석을 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서양화가’였던 유일한 근대 미술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으로선 서양화라는 말이 참 어색한 분류이기도 하지만, 당시 먹과 종이를 재료로 중국회화의 전통을 따르던 한국미술과 분리할 수 있는 또 다른 언어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혜석이 여성으로써 최초의 서양화가라면 처음 서양화/ 유화를 받아들였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나도 잘 알지 못하는 중에 서양화를 배워 보려는 생각이 일어나
– 오광수, [한국 현대미술사], 26쪽.
아래 도판은 한국인으론 최초로 1909년 동경 유학길에 오른 고희동이란 인물입니다. 다소 보헤미안적 감상을 남기고 홀연히 떠난 그에게도 사실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그의 다른 일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내가 스물두 살 때였다. 그때는 일본이 우리 나라를 보호국으로 만든지 이 년이 되었고, 필경 합병의 욕을 당하게 되기 삼년 전이었다. (…) 무엇을 하려고 하여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것저것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청산하여 버리고 그림의 세계와 주국酒國에로 갈 길을 정했다
– 오광수, [한국현대미술사], 26쪽
그 당시 궁내부(왕실 업무를 총괄한 관청) 주사를 역임하여 궁중 내 프랑스어 통역과 문서 번역을 맡았던 그는 조선과 일본의 을사늑약 이후 세상을 달관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를 시작으로 나혜석과 김찬영 등이 동경으로 갔고 역시 책에 등장한 김환기와 유영국 또한 1930년대 일본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오늘날 박서보는 자신의 스승으로 김환기를 언급하니 여기서 한국미술의 ‘서양화’ 명맥을 대략 알 수 있을 듯합니다. 한국 근대사에서 서양화는 단순한 서양 문물의 유입이라기보다 근대화의 틈에서 예술가들이 확보하고자 했던 독립적인 언어라고 보는 편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림들이 그리고 오늘의 한국 미술가들의 그림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풍경화라는 통속적인 명칭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이 단어는 어쩐지 손 기술에 불과한 것을 의미하는 듯해서 나의 온몸 이 거부감을 느낀다. (…) 이제 나는 다음과 같은 단어를 제안한다 지구생명 지구생명의 그림.
– 카를 구스타프 카루스, 풍경화에 대한 [아홉 개의 편지](Neun Briefe über Landschaftsmalerei) (1831)
박재용의 노트
책을 읽으며 들었던 (어쩌면 책에서 다룬 내용과는 관계가 없을지 모르는) 단상.
- 미술계 동료(아마도 고은님)과 이런 기조의 가벼운 대화를 나눈 적 있습니다. ‘아마 아티스트/큐레이터(들)이야 말로 ‘궁극의 관종’이 아닐까?’ 하지만 미묘한 지점이 존재하는 것이, ‘관심 받고 싶지만 관심 받고 싶지 않아’, ‘내 아메리카노는 뜨겁지만 차가웠으면 좋겠어’ 같은 느낌의 관종이 아닐까.
- 이 책에서 작가의 삶을 설명하다 문득 화랑, 경매 판매가를 언급하며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서술이 등장하는 부분은 무(無)소유를 말하되 풀(full)소유의 삶을 사는 것으로 화제가 되었던 모 불교인이 어렴풋이 떠오르기도 한다.
- 책에서 다루는 작가들은 생몰년도가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지나지 않은 이들이다. 이들이 활동하던 당시에도 미술은 하나의 단단한 ‘제도’로 존재했고, 지금은 그것이 더 (접근성이 높아지고 국가의 경계를 더 뛰어 넘으며 장소를 가로질러 동기화되었다는 의미에서) ‘민주화’되었으며 따라서 더 공고한 ‘제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 그런 면에서 ‘미술’이라는 예술 분야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보수적 성격과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을지 모른다.
- 변월룡의 이야기는 흥미롭다. 그를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던 계기는 2016년 2월 워싱턴에서 열린 “College Art Association” 연례 학술대회의 한 세션 “Building an Alternative Modernity: Artistic Exchange between Postwar Socialist Nations”(링크)에서 판 베를렌이라는 한국계 미술가가 북한의 미술학교 재건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20세기 초반에 (여러가지 제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국제 미술 교류가 있었다는 걸 알게되면서였다.
- 책에서도 다뤄지고 있지만, 2019년 국립현대미술관에는 전시 [변월룡 1916-1990](링크)을 열었다. 당시 전시를 관람하기 전, 역사에 휘말린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 외에도 국가를 넘어선 국제적 예술의 교류라는 당시의 더 넓은 맥락이 어떤 식으로 언급될 지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전시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언급되지 않았고, 북한과 관련한 내용 역시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아 아쉬웠다.
함께 생각해볼 거리
- 이 책을 읽으며, 가장 인상 깊은 작품은 무엇이었나요?
- 이 책의 서술은 작가의 일생과 작품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바라봅니다. 우리는 미술을 감상할 때 작가의 생애, 개인적 배경과 작품을 얼마나 연결 지어 생각해야 할까요?
- 잠시 조지 오웰을 인용해봅니다. “예술은 정치와 무관해야 한다는 의견 자체가 정치적 태도인 것이다.” 책이 다루는 작가들의 삶에 비추어 생각해볼 부분이 있을까요? (오웰 인용 참조: “오웰의 작가론…”글쓰기는 결국 정치적이다””(한겨레 기사 링크)

독서노트 인용
이성자였다. 작년 5월, 마스크와 우산을 쓰고 가서 본 ‘갤러리 현대 개관 50주년 기념전시’에서 김환기의 [우주]등 유수의 낯익은 작품들 사이 낯설지만 유독 내눈과 맘에 들었던 작품 [오작교]. 그 작품의 주인공(…)다음에 프랑스 출장을 가면 남부에 있다는 그녀의 아뜰리에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
– ㅈOO
남관 그림의 “푸른 색”을 보고 “참 좋다”라고 느꼈다. 어떤 요소 때문에 나는 이 그림을 보고 좋다고 느끼는 것 일까?
– LOO
김창열의 물방울 그림 첫인상이 지금도 생생하다.(…)통상 한지 같은 종이에는 물이 스며들기 마련인데 배경의 물성을 무시하고 영롱하게 맺힌 물방울은 그 존재만으로도 뭔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듯 했다.
– BOO
와 너무 멋지다 하면서 페이지 한 구석을 접은 작품은 많았지만 유독 마음이 콱 붙잡힌 것 같은 울컥함은 윤형근 화백의 작품에서만 느낄 수 있었는데, 애틋함이 밀려왔고 이유 모를 위로가 느껴졌달까.
– POO
식민지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전쟁 중인 것도 아닌데도 이렇게나 내가 가진 것(혹은 가질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소신대로 살기가 어렵다.(…)”죽을 때 까지 이 긴장의 끈을 바싹 나의 내면에 동여매고 작업에 임”했다는 것이 존경 스럽다(p.257)
– COO
시간이 여의치 않을 땐 전시는 보지 않더라도 미술관 마루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바람을 느껴보기도 하고, 가만히 앉아 멍- 하니 미술관에 온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도 좋다.(…) 그렇게 미술관에 자주 가면 좋은 점은(…)사람과 작품 사이에도 은근한 ‘내적 친밀감’이 생긴다.
– LOO
…’사람들이 서서 바라봐줄때 그림은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국의 근대 역사와 함께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저자는 학술적인 전문 용어 대신 아주 쉬운 언어로 쉽게 설명하고 있다.
– LOO
나는 내가 미술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왔지만 가끔 어떤 작품이 100억, 200억이 되는 가격에 팔릴 때 ‘무슨 마음으로 저 가격에 사는 걸까?’ 같은 의문이 들 때가 있었다. 하지만 화가들의 수많은 연구와 삶을 더 알면 알 수록 그 작품들은 화가들의 분신같이 존재고 대체할 수업하는 것들이란 생각이 든다. … 내가 그림을 보는 방식이 조금씩 갈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 ㄱOO
…솔직히 목차를 펴고 조금 설레기까지 했다. …이 책의 또 다른 묘미는 한국 작가들의 유년 시절을 비롯한 삶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책을 재밌게 읽는데 큰 일조를 한 것 같다. 삶을 보다 풍요롭게, 신비롭게 해줬던 소중한 탐험이었다.
– ㅇOO
“‘살아 남은’ 그림들은 현재의 우리가 살아남아야 하는 삶에 힘을 준다”
…묘사란 너무 객관적이면 재미가 없고 해석하는 이의 상상이 보태져야 좀 더 맛깔나게 느껴진다. …여러 작가 중에 나에게 가장 맛났어 이는 윤형근이었다. …부정 입학 비리를 폭로했다 반공법 위반으로 끌려가 형무소에서 복역한 그의 삶과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당대에 목도하고 일부만을 토했던 그의 분노가 그의 그림들에서 어떻게 그렇게 단순화될 수 있는지, 그렇게 단순한데도 그 마음이 느껴져서 더 깊이가 있게 느껴지는 듯하다.
– COO
“살아남은 나의 끄적임”
…책에서 만난 미술가들은 어땠을까. 포탄이 터지는 피난길을, 나라를 뺏긴 일제 치하에서도 죽음을 곁에 두고 치열하게 그림을 그린 건 어떤 이유였을까. 아마 우리 인간이란 망각의 존재이며, 결국엔 죽음 앞에 유한한 존재임을 본능적으로 알았기에, 자신의 흔적들을 그림으로 붙잡아 ‘살아 있음’을 영원히 새기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아니었을까.
– ㄱ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