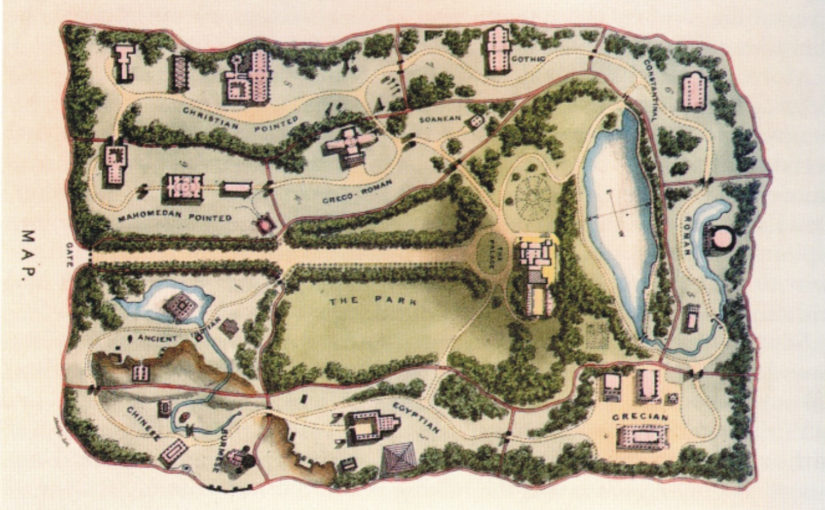[소비중독 바이러스 어플루엔자]와 [소비를 그만두다]를 읽고, 다시 두 권의 책 [사물들]과 [오래된 농담]을 읽어보았습니다. (두 번의 모임에서 네 권의 책을 읽었으니, ‘취향있냥’은 ‘가성비 최고’인 걸까요?)
박완서와 조르주 페렉 두 작가의 책 모두, 소비사회에 접어든 사회의 인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물들]은 원래 부제가 “60년대 이야기”이기도 해요. (50년대 중반에서 60년대 초까지 알제리 전쟁이 있었다는 것, 68년에는 68혁명이, 같은 시기 한국에서는 박정희의 쿠데타가 있었다는 점을 떠올려 봅시다.)
두 소설 속 인물들 모두 갈팡질팡 합니다.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원하는 건 무엇인지 갈팡질팡합니다.
여러 멤버들이 독서노트에서 지적해준 바와 같이, [사물들]의 실비와 제롬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보다 자기가 ‘원해야 할 것 같은 것’을 쫓아다니죠. 갈팡질팡하는 건 [오래된 농담]의 주인공들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주요 등장 인물인 영빈의 형인 영준은, 어쩌면 남들이 돈으로 갈팡질팡하는 사이 약간의 비법 혹은 비결을 익힌 사람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돈이란 무엇일까요? 게오르그 짐멜이 [돈의 철학]에서 이야기한 것 처럼, 돈은 그 자체로는 그 어떤 가치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혹은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돈에 휘둘리는, 소비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사물들]의 부제가 “60년대 이야기”라는 점은 참 재미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공간과 시간을 2019년의 한국으로 바꿔 읽어봐도 전혀 낡아뵈지 않을 듯 하니까요.)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회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선택은 결국 뻔하디 뻔한 것 뿐일까요? ‘취향’이란 결국 그런 (다양해 보이지만 결국 선택지의 수가 제한되어 있는) 선택의 발현일 뿐인 걸까요?
‘취향’을 찾아 왔는데, 갑자기 책도 두 번의 모임 만에 네 권이나 읽으라 하고, 자본주의와 소비에 대한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구나, 하고 적잖이 당황 중이신 멤버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첫 모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임에서 우리가 해보려는 것은 망원경과 현미경으로 우리 자신의 내부와 외부를 둘러보는 것이니 조금만 더 끈기 있게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모임은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 지난 한 달의 업데이트 (1인당 제한 시간: 5분, 자유 주제)
- 두 책의 전반적인 인상, 의견, 코멘트
- (쉬는 시간은 진행 상황을 봐서 적절한 타이밍에)
- 사진 기록 남기기
- 세 가지 생각 거리를 읽고, 염두에 두면서 –
- 발췌문 함께 읽고, 의견 나누기 & 세 가지 생각 거리에 대해 의견 교환
- 번개 추진위원회 뽑기
- 다음 책에 대한 의견 수합
- 마무리 발언
세 가지 생각 거리
- ‘취향있냥’이라는 모임의 틀을 통해 바라보는 두 책에 대한 감상 (왜 이 두 권의 책을 ‘취향있냥’에서 읽은 걸까?)
- ‘물건’이 아닌 것을 통해 나의 취향을 밝혀볼까요? 추상적인 것에 대한 호오를 밝혀도 좋습니다.
- 조금 사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수도 있지만 – [사물들], [아주 오래된 농담]의 인물들에 비춰 나의 일상/삶을 반추해본다면…?
‘사물들’의 두 주인공인 실비와 제롬은 초년생일 때 두 주인공은 잡지, 주변 친구들, 혹은 돈 많은 부자들의 소비를 따라하고자 한다. (중략) 그들은 잡지에 나오는 화려한 물건들과 동일한 혹은 비슷한 물건을 사면서 상류층의 삶에 조금이라도 편입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중략) 돈이 떨어지고 튀니지로 간 그들은 거기서 소비를 멈춘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웃기는 상황이다. 아무런 광고나 이상향이 없는 곳에서 그들은 소비를 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고 오히려 지침을 느낀다. 그러나 다시 파리로 돌아와 그들은 새로운 직장을 찾고 이전의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욕구를 찾아가게 된다.
– 전ㅂ&
우울과 결핍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 있을까? 독후감을 쓰기 위해 몇 주의 간격을 두고 읽은 두 권의 책을 떠올렸을 때, 나는 공간이 묘사하고 있는 비애가 생각났고, 그 공간을 되짚어 보는 것으로 서평을 작성해보기로 했다.
– 김ㅈ&
(중략)
나는 결국 멋지고, 단순하며, 감미롭게 빛나는 사물들 사이에서 소유와 욕망의 균형을 찾게 되는 날을 더 앞당기기 위해, 피아노를, 진짜 계획을 한참 미루는 쪽을 택한걸까? 언젠가 오래된 동네의 큰 집을 사면 정말 행복해질까? 평범한 청년이 지금 취향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스러기 부 정도에 대한 욕망조차 이기기가 쉽지 않음을 느끼는 나날이다.
1 그래도 돈이 있으면 고민이 줄지 않을까? – 날짜에 맞춰 항공편을 찾아보며 원하는 항공편이 원하는 가격으로 없는 것을 느꼈을 때-
– 최ㅅ&
2 ‘완벽하지 않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하는 쪽을 택했다.(사물들, 26p)’ – 나도 그렇다 –
1960년대, [사물들]의 프랑스와 [아주 오래된 농담]의 한국은 같고 또 다르다. 역사 상 처음으로 (먹고 사는데 필수적인 것 외의 소비를 할 수 있는) 물질적 풍요를 알아가는 사회라는 점이 같다면, [사물들]의 제롬과 실비는 위태로운 중산층인데 [아주 오래된 농담]의 영빈과 영묘는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중략)
Q. 개인의 불행의 크기를 절대적으로 잴 수는 없겠지만, 굳이 고른다면 실비와 영묘 중 누가 더 불행한 걸까?
– 박ㅎ&
A. 막상막하지만.. 저는 00이 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힌트는 아래 책 발췌)
“전혀 경제권 없이 풍족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못할 노릇인지 당해보지 않고는 아무도 모르리라.” (아주 오래된 농담, 184p)
“근근이 살아갔다. 돈을 쉽게 써버렸다. 사흘 일해 번 돈을 여섯 시간 만에 써버리기도 했다. (중략) 그래도 인생은 살 만하다고 생각했다.” (사물들, 69p)
[사물들]과 [아주 오래된 농담]을 보며 사회의 이념에 따라가는 인물들이 보였다.
– 백ㅁ&
작가가 콕 찝어 말하고 싶은 부분이 부각된 것이긴 했겠지만
– 오ㅇ&
어느 시기나 어느 나라나 사람이 사는 것, 추구하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아주 오래된 농담>, <사물들>의 주요 인물들이 정말 보통의 사람들인 것 같았다.
개개인에게 나름의 큰 일탈이고 쾌락이지만, 어쩌면 답답한 새장에서 잠깐 나오고 싶어하는 ‘작은 날갯짓’ 정도가 아닐까.
가구나 침구, 가전제품, 일상복과 특별한 날 입는 옷은 개인의 선택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은 것 같다.
– 김ㅈ&
… 결국엔 경제력이 관건이다. … 하지만 인간은 실수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마음이 바뀌고 또 실수를 한다. … 무엇을 중심으로 잡고 살아갈지 그게 핵심이 아닐까.